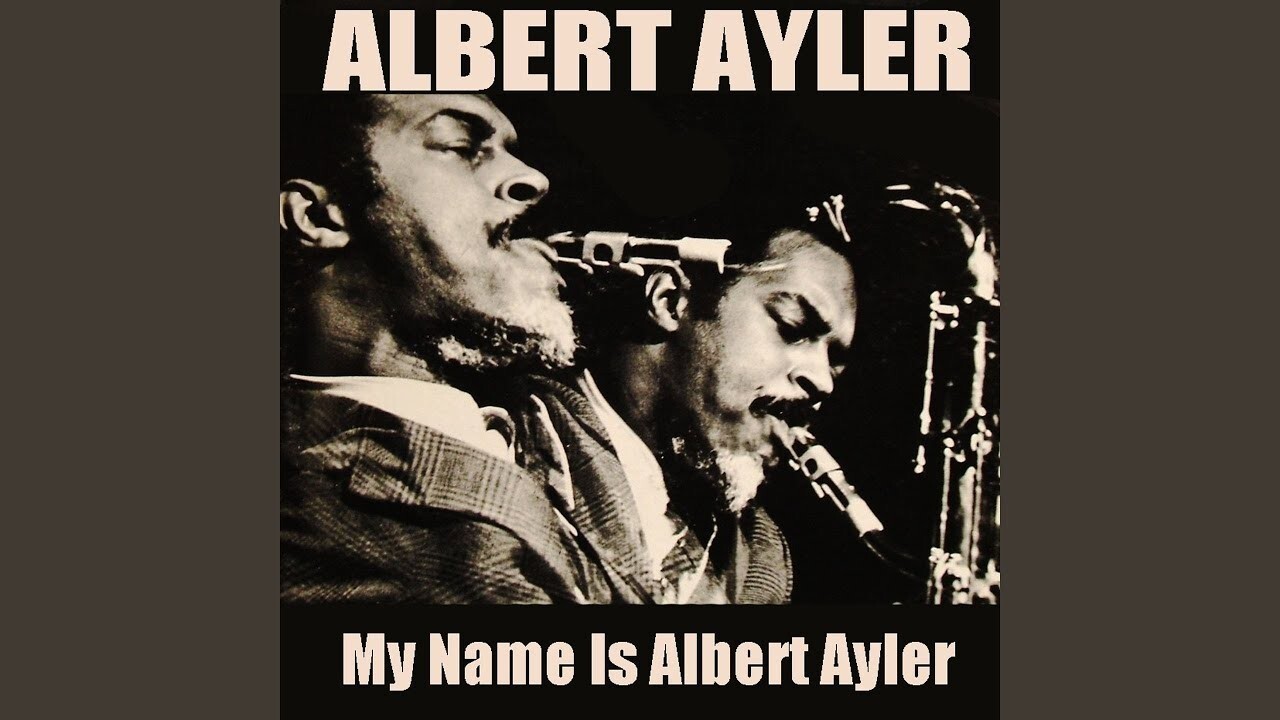내 인생의 재즈사
(불란서여배우)
서울 여행은 잘했나요, 은?
[김은] [오후 5:54] 삼십 몇 년 만에 만난 친구들이 불과 며칠 전에 만난 듯. 시간의 간격을 뛰어넘는 경험을 했네. 신기하더군.
[김은] [오후 5:56] 지금 이 여행에 대해 할 말이 너무 많아. 이야기들이 폴짝폴짝 뛰어다니네. 내 가슴 속을, 머릿속을.
[김은] [오후 5:59] 아득히, 몇날 며칠을 군산을 떠나갔다, 혹은 현실을 떠나, 과거로,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시간여행자 같아. 그 흥분이 아직도 진동 중.
(불란서여배우)
좋아.
그 진동이 느껴져.
위의 카톡 대화는 제가 살고 있는 군산의 동잘녀(동네에서 잘난척하는 여자들) 모임 단톡방의 대화입니다.

저는 지난 금요일 26일, 마포 아트센터의 25년 만에 재결성되는 서울 재즈 쿼텟을 직관하기 위해 1박 2일 서울 여행을 했답니다. 미루고 있었던 대학 친구 2명을 이 콘서트에 초대했죠.
89년 이후로 소식이 끊긴 친구들을 어렵사리 페이스북을 통해 찾았지만, 친구의 암투병과 펜데믹이 연이은 바람에 4년간 간간히 소식만을 주고받다가 이 콘서트를 계기로 1박 2일의 짧은 만남을 통해 30년도 넘는 시간의 갈피들을 펼친 셈.
금요일 점심을 나누고 한가람 미술관의 “앙리 카르티에 브레송” 사진전을 관람하며 “결정적 순간”의 아름다움도 경험하고, 쇼핑도 좀 하고 사진 몇 컷도 남겼죠.


친구 둘 중 한 사람은 홍제동 성당, 다른 한 친구는 대치동 교회의 성가대의 일원이면서 때론 주변인들에게 반짝이는 순간들을 위한 “토치” 역할을 하며 훌륭한 자녀들을 키워낸, 오랫동안 클래식 위주로 음악을 듣던 그네들에게 그날 밤 공연은 신세계를 선물한 듯. 재즈의 재발견이었고, 10월 21일 연세대 백주년 기념관에서 열릴 서울 재즈 쿼텟의 다음 공연 땐, 아들딸들에게 꼭 가보도록 권유하겠다고, 발갛게 상기된 얼굴에서 반짝이는 눈동자가 그날 밤 연주회의 열기와 감동을 전해주었죠.

콘서트는 4중주단의 연주가 아니라, 모든 관람자들의 열기를 더해 5중주단의 음악이었죠. 니체가 말하는 인간 정신의 세 단계 변화 (낙타 - 사자 - 어린아이) 중 바로 어린 아이의 단계, 있는 그대로의 나, 꼭꼭 내면에 숨겨둔 순진무구한 어린아이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낸, 환호와 박수, 위버멘쉬와 가까운 유희하는 인간의 발현을 경험한 셈이라고 한다면 제가 너무 호들갑을 떠는 것인지요?

(출처: 남무성님의 페이스북에서)

(출처: 남무성님의 페이스북에서)
무대 인사에서 이정식 선생님의 눈가에 맺혔다 했던 눈물의 의미는 지난 세월의 마디마디에 새겨진 인생의 리듬과 멜로디의 재현이었으며, 공감대를 형성했던 모든 이들에 대한 기쁨의 답례였고, 추후 한국 재즈사에 기록될 “결정적 순간”을 보여준, 감동 이상의 그 무엇이었답니다.





콘서트 후, 우리는 재즈 평론가 남무성 작가님의 합정동에 있는 가우초로 달려가 제 오랜 숙원이었던 작가님의 사인도 받고 친구들과 와인잔을 부딪히며 콘서트의 벅찬 감동을 나눴고 하룻밤을 같이 보내고 동행했던 친구 C의 “미리암 도예 공방”을 방문 후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 온 셈.

자화상이란 시를 통해 시인 서정주는 “스물세 해 동안 나를 키운 건 팔 할이 바람이다.”라는 고백을 했는데, 저는 지난 세월 나를 키운 건, 팔 할이 못생긴 내 외모에 대한 콤플렉스에서 비롯된 지적 허영이라고 떠들곤 했죠.
이제 저는 이 문구를 좀 바꿔야겠습니다. 그렇죠. 이 시간 여행을 통해 저는 제 인생의 “결정적 순간”들을 재발견했고 그 감동의 파동이 지금까지도 술렁이고 있고 아주 오랫동안 제 일상의 에너지원이 될 것이 분명하구나, 고개를 끄덕끄덕.
“너 그거 알아? 내 문학에 대한 열정은 대학 3학년 때 네가 빌려준 도스토옙스키 전집을 읽은 덕분이었어.”
“그거 나 고등학교 때 교내 백일장에서 시 부문 장원으로 받은 건데. 나보담, 네게서 꽃을 피웠네.”
양평 문호리에서 “카페 순례자들의 모임”의 구성원이자 대치동 어느 교회의 권사인 K는 세삼 놀라움을 금치 못했죠.
브레송의 결정적 순간이란 이렇듯 일상에 널려있는데, 우린 종종 흘려보내는구나, “찌찌뿅뿅”을 외치며 시간의 나래를 타고 널뛰기를 하는 초로의 여인들의 주름살이 꽤 아름다웠다면 제 착각일까요?
여행에서 돌아오는 내내 “재즈라는 음악은 나에게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끊임없이 하게 되었고, 이제 저는 비로소 제 인생에 새겨진 나의 “재즈사”를 차분히 돌아보게 되었답니다.
놀라운 사실은 어쩌면 그 시작은 미리암 도예 공방을 운영하는 친구 C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깨달았죠.
80년 중반쯤 C는 대학로 연극판을 기웃거리며, 연출자였는지, 연기자였는지 기억도 까마득하지만 한 남자를 사랑했고, 그로부터 전해 들은 음악에 대해 열변을 토했고, 클래식과 샹송과 깐쪼네만 들어왔던 나에게 그녀가 소개해준 음악은 신세계였던 셈. 제가 최초로 산 엘피가 바로 척 멘지오네Chuck Mangione의, 영화 ‘산체스네 아이들’의 OST였다는 사실.

Children Of Sanchez
https://youtu.be/28ds69kqY8s?list=OLAK5uy_lFImZCUtJN-Yt0_NFBcQ1xNj88Pj7aL-I
Musicians
James Bradley Jr. - Drums
Dick Decker - French horn
Grant Geissman - Guitar
Chuck Mangione - Flugelhorn
Charles Meeks - Bass guitar
Jerry Peel - French horn
Don Potter - Vocals
Phyllis Hyman - Vocals
George Stimpson - French horn
Mayo Tiana - Trombone
Jeff Tyzik - Trumpet
Chris Vadala - Clarinet, flute, soprano sax, tenor sax
Brad Warnaar - French horn
Bill Reichenbach - Bass Trombone
이런저런 일로 한국을 떠나게 되었고 90년대 초중반 야간 클럽에서 드러머였던 시드니 랭귀지 클래스의 강사로부터 호주 최고의 재즈 뮤지션인 Vince Jones를 소개 받았죠. 주로 보컬 위주의 재즈 스탠더드로 구성된 CD는 제 보물 1호가 되었고, 귀국할 때 그의 음반 몇 개를 사들고 왔답니다.
Never Let Me Go
https://youtu.be/zOkBri-7Dh8
Vince Jones – trumpet, vocals
Doug de Vries – guitar
Peter Jones – piano
Paul Williams – tenor saxophone
Wilber Wilde – tenor saxophone
Peter Whitford – drums
Gary Costello – bass
이제 서울에서 “재즈”라는 음악을 찾아 나서게 되었고 그 첫출발은 이대 후문에 있었던 클럽 “야누스”였답니다. 박성연, 최선배, 최세진, 강대관등의 한국 재즈 1세대들의 연주를 들을 수 있었던 영광스런 시간을 누렸는데, 언젠가 야누스의 간판이 없어졌고, 어딘가로 이전을 했다는 안타까운 소문을 접하고 말았죠.
하지만 신촌 옥탑방 월세살이의 가난한 여행사 직원이었던 꼬질꼬질한 제 삶에 단비와 같은 역할을 했던 재즈, 이 녀석은 저를 대학로 “천년동안도”로 이끌었고, 딱 거기까지, 제 주머니 사정은 더 이상을 허락하지 않았답니다.
우연한 계기에 이정식님과 곽윤찬님, 윤희정님의 라이브 연주뿐만아니라 시골 아줌마이면서 동잘녀(동네에서 잘난척하는 여자)였던 제가 척 멘지오니와 다이안 리브스의 전주 공연은 재즈라는 음악의 끈을 놓을 수 없게 했지요.
그 후, 1995년 12월15일부터 국내 유일의 라디오 재즈프로그램 '이정식의 올 댓 재즈'가 CBS 음악FM(93.9㎒)을 통해 재즈에 대한 갈증을 증폭시켰고 남무성 작가의 <Jazz It Up>을 위시해 1997년 대한민국 최초의 재즈 월간지인 <몽크뭉크(현 MM JAZZ)>를 정기구독하면서 재즈와의 인연을 계속했는데 말이죠.
https://youtu.be/V0pgMqqOos0?list=OLAK5uy_nF5nFbUC10rcrE_gdKmNJlgRq7JnAmi1c
https://youtu.be/Z7FIDW1yURQ?list=OLAK5uy_nF5nFbUC10rcrE_gdKmNJlgRq7JnAmi1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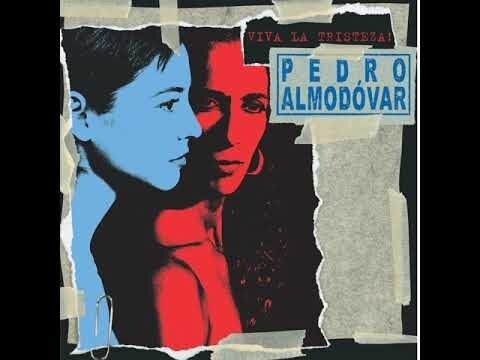


그리고, 어느 날, 어느 재즈 밴드에 포스팅된 바로 이 연주를 들었는데, 확 미칠 뻔했답니다.
Albert Ayler의 테너 색소폰, Niels Brosted의 피아노, Niels-Henning Ørsted Pedersen의 베이스, Ronnie Gardiner의 드럼으로 구성된 4중주단의 앨범 My Name Is Albert Ayler(1963년) 속의 "Summertime",
https://youtu.be/WAS_K9msmgc?list=OLAK5uy_mCX6XkP5fSXK2XBqh0vqj4UFtAWlgwSZI
자신의 감정 내면의 목소리와 연결된 몽상가 아일러의 트레이드마크인 울부짖음, 멜로디의 구조와 음악에 대한 통념을 무시한 초월적인 위엄과 거의 믿을 수 없는 파토스의 열정적인 연주는 그야말로 재즈라는 음악의 광활한 지평을 열어주었다고나 할까요?
이 지점에서 저는 제 롤러코스트와 같은 인생이 왜 재즈라는 음악과 어울렸는지, 깨닫지 않을 수 없었죠. 억누르고 살았던 내 내면의 어떤 것들이 언젠가는 이처럼 분출하겠구나, 그때를 향해 걸어가자, 비록 눈물 나는 삶일지라도, 때론 해찰을 할지라도, 뚜벅뚜벅 걸어가자.
재즈, 너와 함께라면 외롭지는 않겠지, 재즈, 너와 함께라면 내 자존을 지켜주겠지, 너와 함께라면 어느 날 내 옆구리에 날개가 생겨 이 광활한 우주를 함께 날아다닐 수 있을거야. 뭐 그런 일종의 자가 심리치료이자 미래에 대한 확신, 아무 것도 아닌 내가, 반짝이는 별로 재탄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볼 수 있었다면 웃으실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헐, 이게 뭡니까? 철학자 휴버트 드레이퍼스와 숀 켈리는 이렇게 외치지 뭡니까?
“All things shining((세상에) 모든 것은 빛난다./사월의 책)”
이른 아침에 일어나 음악을 듣고 커피를 마시는 하루의 시작, 8월의 끝자락 힘 잃은 햇살에 스민 바람의 냄새를 감지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브레송의 “결정적 순간”을 맞이하는 것이고 단지 그 순간을 감지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는 전적으로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음을, 알려주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왜 그가 먼저 말하느냐고요. 열 받게.
해서 저는 이렇게 변주해봤답니다.
"All humans including me and you, shining."
빛 날 수밖에 없는 너와 나, 우리를 위해 건배하는 의미로 마지막 음악을 보내드릴게요.
10월 26일, 매진된 콘서트 표를 구하려 동분서주하다, 글로만 접했던 플러스 히치, 김충남님께 어렵게 부탁해, 한 장의 티켓을 거머쥔, 삼십 몇 년 만에 만나는 제 친구들과의 만남에 겁도 없이 동행했던 제 동잘녀 모임의 멤버인 예성님의 노래입니다. 재즈는 아니고요.
만일 콘서트 후 가우초에 가면 네가 동참하는 대신, 네 노래를 내 친구들에게 불러주람, 이라고 부탁했는데 막상 가우초에 갔는데, 눈치만 보다 무마된 노래랍니다. 그것이 아쉬워 페이스북에 개제된 이 영상을 이번 초대에 응한 친구들과의 단톡방에 올렸는데.
[김은] [오후 9:23]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pfbid02ArcL35nz4QorNwpjbQ5826EomK4xAKRvCFMTxqcfqSEH36dbcCkQ6jJgMSesjVD4l&id=100017520254934&sfnsn=mo

기차는 8시에 떠나네
좋아하는 노래인데.
찢어진 청바지의 그녀를
어제 보았을까
꿈에 보았을까
거기서 노래하는
그녀가
손에 잡힐 듯한데
말을 걸면
음성이 귀에 닿을 듯한데
우리는
벌써 멀리 있구나
라는 대치동 어느 교회의 권사님이자, 양평 문호리 카페 순례자 모임의 구성원인 친구의 답신을 받았답니다. 이 글을 읽는 분들의 소감은 어떨까요?
마지막 화룡점정,
제가 며칠을 흥분 상태에서 생각해보니, 제 재즈사에 첫 페이지는 제 첫사랑, 그로부터 시작되었음을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그는 시골 교회 전도사님의 아들로 나타났고 조숙했던 저는 중2, 그를 보자마자 훅 가버렸죠. 중3 가을 그림을 그리던 제 친구의 집에 놀러갔더니 그가 들고 왔다던 가을 코스모스 한 아름이 책상을 장식했더군요. 그때의 쓰라림이란!
고1, 코스모스 한 아름의 주인공이었던 친구는 알 수도 있을 이유로 극단적 선택을 했고, 철 이른 장맛비가 쏟아지던 날, 하필이면 버스가 고장나서 하염없이 철길을 따라 시내의 학교까지 걸어가야 했던 그날, 그의 눈물로 범벅된 얼굴을 확인하며 더없이 울어야했던, 그 후 가을쯤 어느 날, 트럼펫으로 울어대는 “하늘 가는 밝은 길이”라는 연주를 들었지 뭡니까. 학교 밴드 부 단원이었던 그의 박자와 리듬이 무시되고 곧잘 삑사리 나던 연주였건만, 내 가슴 속으로 물밀 듯 밀려들던 그의 연주에서 비롯되었다는, 아하! 그래서 나는 유난히 트럼펫이란 악기의 음색을 좋아하는구나, 내 재즈 사랑의 시작은 첫사랑 그 머시마로부터였단 말인가, 이 수다를 피우며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온답니다.
제 40살까지 나를 키운 건 제 컴플렉스를 극복하기 위햔 지적 허영이었다면 , 그 후 20여년간, 나를 키운 건 비루한 나의 일상들을 견디기 위한 무기가
"재즈"였다는 긴 고백으로 이 글을 마감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더불어 누군가의 재즈사도 들어보고 싶다능...
'재즈' 카테고리의 다른 글
| Sheila Jordan의 라이브 앨범 - Live At Mezzrow(2022년) (0) | 2022.09.04 |
|---|---|
| Jimmy Scott의 스튜디오 앨범– I Go Back Home - A Story About Hoping And Dreaming(2016년) (0) | 2022.09.03 |
| Jacopo Ferrazza의 스튜디오 앨범 – Fantàsia(2022) (0) | 2022.08.24 |
| Samara Joy의 스튜디오 앨범 - Samara Joy(2021년) (0) | 2022.08.21 |
| 그대들을 춤추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0) | 2022.08.20 |